인터넷 다음 포털 검색어 창에 문예지 《작가세계》를 검색해보면 ‘어학사전’의 “우리말샘”이라는 항목에서는 이렇게 기술되고 있다. “1989년 여름에 창간된 계간 문예잡지. 초대 편집인은 평론가 이동하와 시인 최동호이다……” 처음부터 틀린 설명인 셈이다. 항목을 서술한 장본인이 ‘최승호’를 ‘최동호’로 서술해놓고 말았다.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착각해버린 모양이다. 이런 오류는 인터넷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되는 사항이다.
시인 최승호가 창간한 문예지 《작가세계》 발행인의 이름도 착각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다. 창간호의 가장 끝 페이지에 실려 있는 판권란 발행인의 이름은 ‘최성호’이다. 자본을 출자해서 잡지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이 발행인의 몫인데 최성호 씨는 파티마 병원을 설립하고 성형외과 분야에서 큰 실적을 남긴 분이다. 세간에서는 “남궁설민”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발행인이 출판유통업을 하는 ‘최선호’ 씨로 바뀌어 버렸다. 이렇게 되니 최승호와 최성호와 최선호라는 이름들이 번갈아서 등장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이 잡지 판권 명단에 들락거리다 보니 관할 세무서에서 세 사람이 가족관계가 아닌지 확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내가 등단한 지 얼마 후인 1980년대 말에는 문학평론가이며 모두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1980년대에 등단했으며 연배도 엇비슷한 이남호와 이광호와 이경호의 관계가 이야깃거리가 되거나 사람들에게 착각을 불러일으켰던 적도 있다. 1989년 겨울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느 문학상 시상식장에서 중견 문학평론가이며 서강대 국문과에 재직하고 있는 이재선 교수가 나에게 다가와서 반가운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다.
- 아버님한테 이야기 들었네.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하기 바라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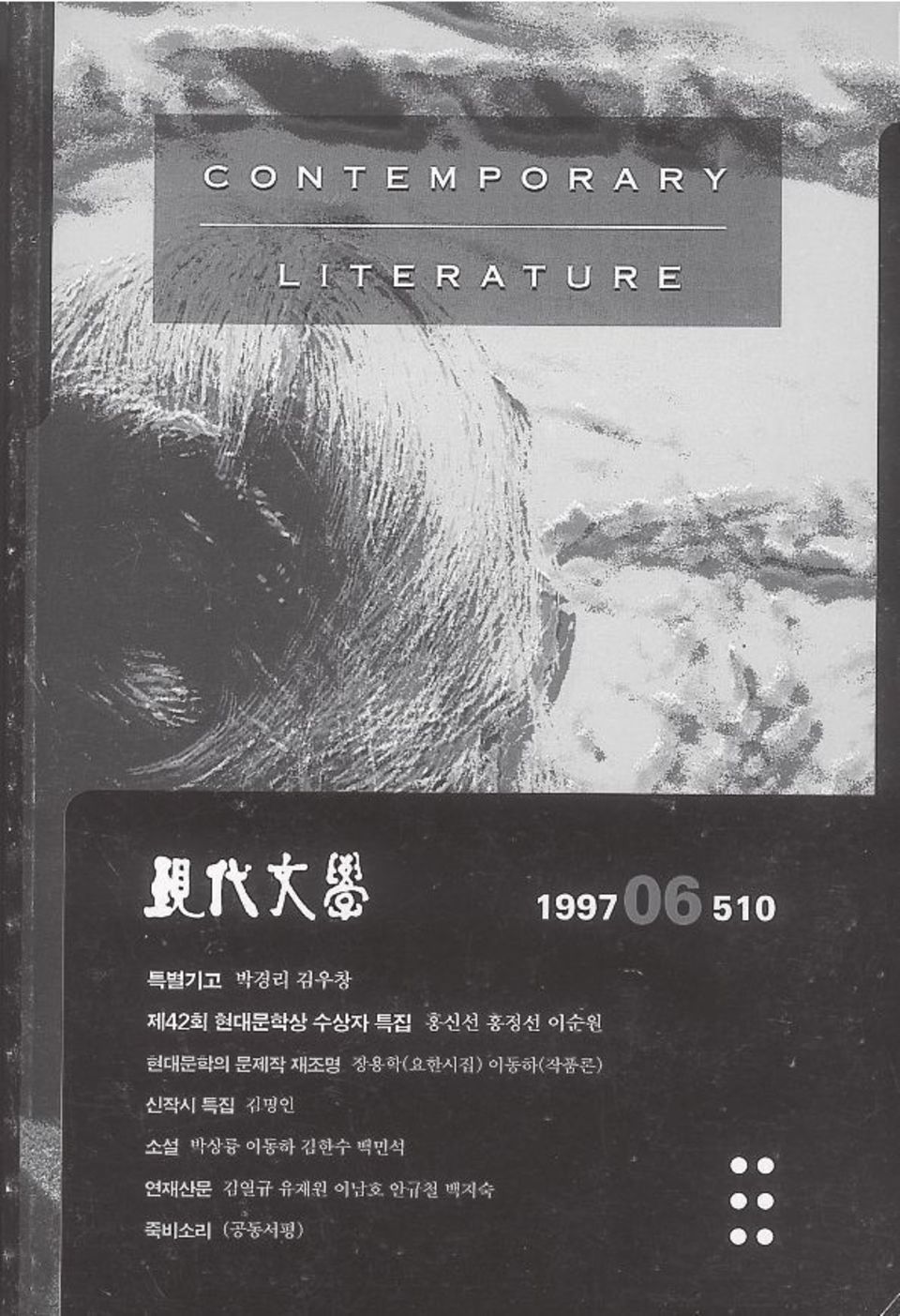 1997년도 《현대문학》 6월호 (현대문학 제공) |
그는 내가 등단한 비슷한 시기에 우찬제와 김경수라는 두 제자가 신춘문예를 통해서 문학평론가로 등단하는 보람을 챙긴 바 있었다. 그런 그가 나로서는 도무지 요령부득인 덕담을 꺼내는 바람에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었다.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그 자리를 물러난 이후로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그날 그가 건넸던 덕담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이광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이광호의 부친인 원로 아동문학평론가 이재철 교수와 친분이 있었기에 나를 이광호로 착각했던 것이었다. 그 후에도 이런 일은 자주 반복되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친구인 이남호와 형제 관계로 오해하기도 했다. 이남호와 나는 같은 학번이었으나 그는 고려대 국문과 출신이었으며 나는 영문과 출신이었다. 우리는 1970년대 후반에 고대문학회 모임에서 안면을 트고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었다. 이광호는 고려대 사범대학교 국어교육과 출신이었으며 나이는 나보다 여덟 살 아래였다.
문단에서 이름이 초래하는 착각은 원고료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1960년대 전반기에 출생하고 1980년대 후반에 등단을 하고 1990년대에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소설가 박상우와 시인 박상우의 관계가 그랬다. 나는 두 사람에게서 잡지사의 원고료가 잘못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었다. 소설가의 원고료가 시인에게 송금되어 버렸던 것이다. 두 사람 모두와 안면을 트고 지냈던 나는 그 돈을 돌려주었는지 시인 박상우에게 물었고 그는 아쉬운 표정으로 소설가 박상우의 전화를 받고 돌려주었노라고 고백한 바 있다.
단지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을 받는 경우도 문단에서 발생했다. 1983년에 《문예중앙》 신인상으로 등단한 박세현은 어느 날 동갑내기 시인으로부터 으름장을 놓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전화를 넣은 장본인은 그보다 4년 먼저 《문학과지성》으로 등단한 박남철이었다.
- 박형, 축하해요. 그런데 나하고 이름이 같네.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이 생길 것 같으니 이름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성적이며 순박한 성품을 가진 강원도 청년 시인 박남철은 단지 몇 년 선배라는 이유만으로 우격다짐을 넣는 동명이인의 선배 시인에 대해 수소문해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문단에서 왈패에 가까운 언행으로 여러 차례 소동을 일으킨 사실도 알아냈을 것이다. 결국 그는 필명을 박남철에서 박세현으로 바꾸고 말았다.
문단에서는 이름이 똑같거나 비슷해서 생겨나는 문제도 많았지만 이름을 확인할 수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1997년의 《현대문학》이 그랬다. 우리나라의 최장수 문예지라는 빛나는 전통을 간직한 《현대문학》은 1997년에 수십 년의 전통을 일신하는 변모를 세간에 과시하여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다. 가장 낯설게 다가온 변화는 표지에서부터 목차와 본문에 이르기까지 환골탈태를 해버린 디자인과 글씨 모양이었는데, 글씨 모양의 변화를 주도한 장본인은, 소위 “안상수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한 안상수였다. 당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학과 교수였던 그가 개발한 글씨체는 아직 대중적 인지도가 높지 않았었는데 가장 보수적인 전통을 고수하는 문예지에서 그런 글씨체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화젯거리였던 셈이다. 현대문학의 전통에 익숙한 독자나 문인들의 불평이나 저항이 적지 않았으나 《현대문학》 창립자이며 모기업인 대한교과서 사주의 며느리였던 양숙진이 편집인이자 주간으로 부임하며 내린 결단이었기에 혁신의 고삐는 늦추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다.
문예지의 모양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파격적으로 뒤바뀐 상황에는 당시에 기획실장으로 재직했던 내 역할도 개입이 되었다. 나는 《현대문학》으로 자리를 옮기자마자 양숙진 주간에게 뛰어난 필력으로 문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인들을 편집기획위원으로 영입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문학평론가 김화영과 이남호, 소설가 이윤기, 시인 최승호, 그리고 번역가 이재룡이 기획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양숙진 주간과 나는 기획위원들과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을 가졌으며 문예지 필자를 선정하고 지면을 구성하는 작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는데, 어느 날 김화영 교수가 귀가 솔깃한 아이디어를 꺼냈다. 그것은 이미 출간되었거나 발표된 바 있는 문학작품을 ‘신랄하게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지면을 마련하고 기획위원들이 모두 필진으로 참여하는 일이었는데, 핵심 사안은 필진을 ‘익명으로 표기하는 것’이었다. 전체 필진을 공개하되 꼭지별 필진은 익명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다소 논의가 분분하기는 했으나 뒤탈 없이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에 의견이 일치되었고, 이윤기가 지면의 타이틀을 “죽비소리”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1997년도의 문단과 출판사와 일간지 문화면의 관심을 들썩이게 만든 ‘죽비소리 논쟁’이 시작되었다. 민음사와 창작과비평과 문학동네 같은 대형출판사에서 출간된 베스트셀러 소설이나 시집이 주로 시비의 도마거리에 올라서 난타를 당했으며 일간지 문화부 기자들은 죽비소리의 저격수가 누군지를 자못 궁금해 했는데, 난타를 당한 문인이나 해당 출판사 편집자는 반론의 지면을 요청하거나 이를 갈았다는 후문이 자자했다. 나는 한동안 문단의 술자리를 기피했으며 필자를 확인하려는 문화부 기자들의 집요한 추궁에 시달려야만 했다. 때로는 엉뚱한 문인이 “죽비소리”의 필진으로 오해를 받아 구설수에 시달리기도 했다. 문단에서 이름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비등했던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결국 세간의 들끓는 관심과 불평이 대상이었던 “죽비소리”는 오랜 시간을 버티지 못한 채 지면의 간판을 내리고 말았다.